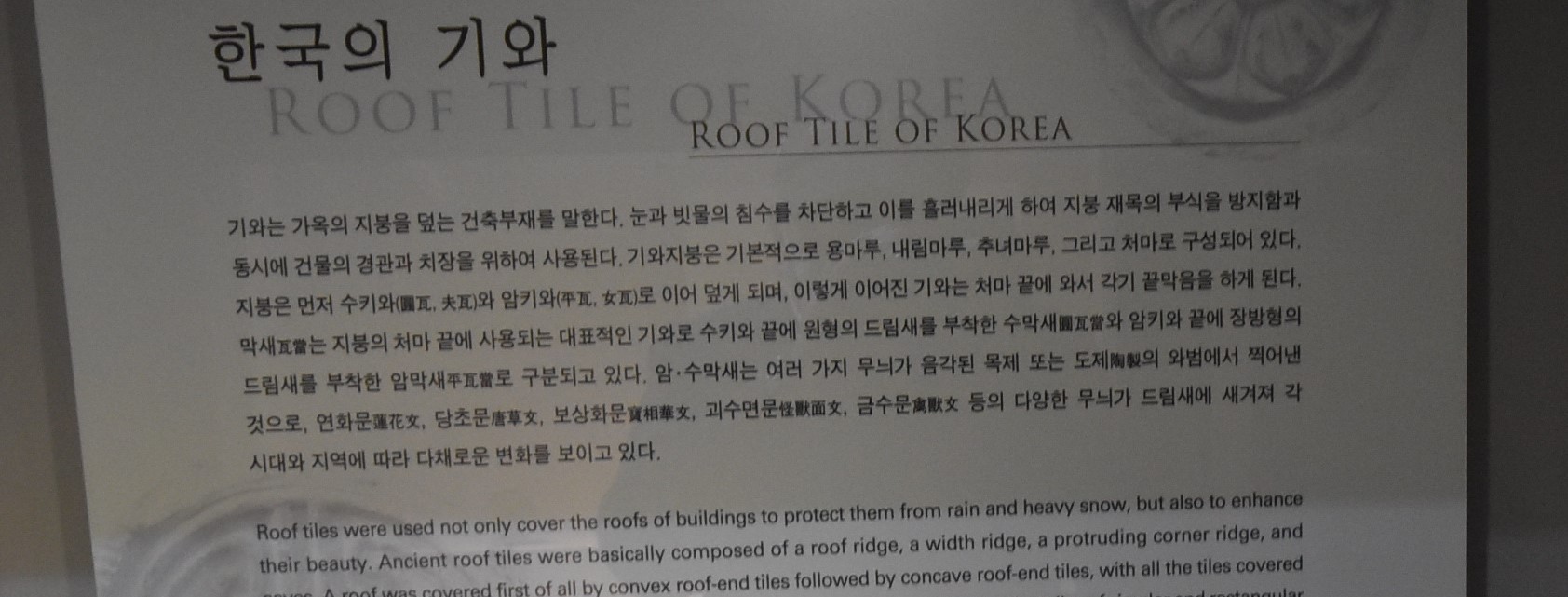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1
데미안2
2022. 2. 27. 18:55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釜山臨時首都政府廳舍)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1]에 위치한다.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제는 부산이 유일한 항만 관문이고 교통의 중심지이며, 산업·교육·문화가 발달하였다는 점 등을 내세워
경남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 식민 통치의 효율을 높이면서, 개항 이후부터 공을 들여
건설한 부산을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23년에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25년 4월에 완공하였다. 이때 진주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병원 건물을 짓는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이 완공되면서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옮겨와
그해 4월 25일 도청 업무를 시작하였다.

줄곧 경남도청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된 후부터 1953년 서울로
환도될 때까지 약 3년여 동안 두 차례 정부청사로 사용되었다. 즉 1950년 8월 18일부터 그해 10월 27일까지
1차 임시수도정부청사로, 1951년 1·4 후퇴 때부터 1953년 8월 15일까지 2차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쓰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경남도청으로 제자리를 찾았으며, 1983년 7월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도청으로서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이후 1984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청사로
사용되다가, 2002년 동아대학교가 매입하여 2009년부터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 전자대전

동아대학교는 고고미술사학으로도 유명한 대학이다.
그렇다 보니 대학박물관이 어지간한 국립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1959년 11월에 중앙도서관 3층에 유물을 진열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9일에 구 경남도청 건물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을 확장하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소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설립자인 정재환은 1959년 중앙도서관 3층에 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초석을 닦았다.
1966년 구덕캠퍼스의 박물관 독립건물로 이전하였고 2009년 5월 19일 부민캠퍼스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건물로 이전 재개관하여 오늘에 이른다.
한국은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하고 주변의 여러 지역과 접촉하며 한민족의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그 문화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공개·전시하며 연구·정리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전통문화를 찾아내고 이를 다시 후학들에게 물려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박물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손색없는
대학 박물관으로 발돋움하여 대학교육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자 한다.

금조총 석실 모형


먼저 불교 문화관으로 들어가 본다

부산 최초의 박물관으로, 총 30,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고고, 도자, 와전, 불교미술, 서화, 민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박물관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소장품의 수준과 가치가 매우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


쇠북

목조보살좌상

금동여래입상. 금동 관음보살입상


금강령

동제 화엄경 변상 경상

시왕도
시왕도(十王圖)는 죽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그린 불화인데,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은
시왕도(十王圖) 10폭 중에서 망자의 몸에 못을 찍는 정신 지옥(釘身地獄)을 묘사한 제1 진광 대왕 도와
추장 지옥(抽腸地獄)을 묘사한 제2초 강대 왕도 등 2점이다. 2점 모두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시왕도(十王圖)는 채색한 구름으로 상단과 하단의 경계를 짓고, 상단 중앙에 의자에
앉은 시왕은 크게, 좌우의 권속은 작고 간략하게 표현하여 시왕의 존엄성을 부각하고 있다. 화면 향 우측
상단에는 방제가 있어 해당 시왕의 이름을 알 수 있고, 하단에는 지옥 장면의 방제가 있어 해당 그림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시왕도들의 색채가 어둡고 탁한 반면에 이 작품의 채색은 붉은색, 녹색 등의 원색과
흰색을 섞은 중간색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시왕과 주요 권속의 얼굴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시왕의 권속 중 천동과 천녀는 이마와 코, 턱에 T자형으로 흰색으로 칠했는데,
이러한 기법은 조선 전기 왕실 관련 불화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시왕도는 조선 후기 시왕도(十王圖) 중 제작연대가 가장 빠른 예로 생각되며,
작품의 크기도 다른 작품에 비해 큰 편으로, 제작연대와 작품성 등으로 볼 때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시왕도

석조 나한상. 석조불상

신중도(神衆圖)
신중(神衆)은 신의 무리를 뜻한다. 104위 신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에는 금강 회상의 석가여래
화현인 대예 적금 강성자(大穢蹟金剛聖子)(예적명왕 또는 오추 슬마)와 주문을 호지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팔금강과 동서 사방을 지키는 사 보살 그리고 여래께서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낸 10대 명왕들이 있으며, 중단은 도리 회상의 제석천왕과 사대천왕, 금강 밀적, 비사문천 왕,
위태천 등의 천신과 사가라 용왕, 염라대왕, 자미 대제, 북두 칠원 성군을 비롯하여 팔부신중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하단은 옹호 회상의 호계 대신, 복덕 대신, 토지신, 도량 신, 가람 신, 조왕, 산신, 수신, 화신, 금신, 목신, 토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상

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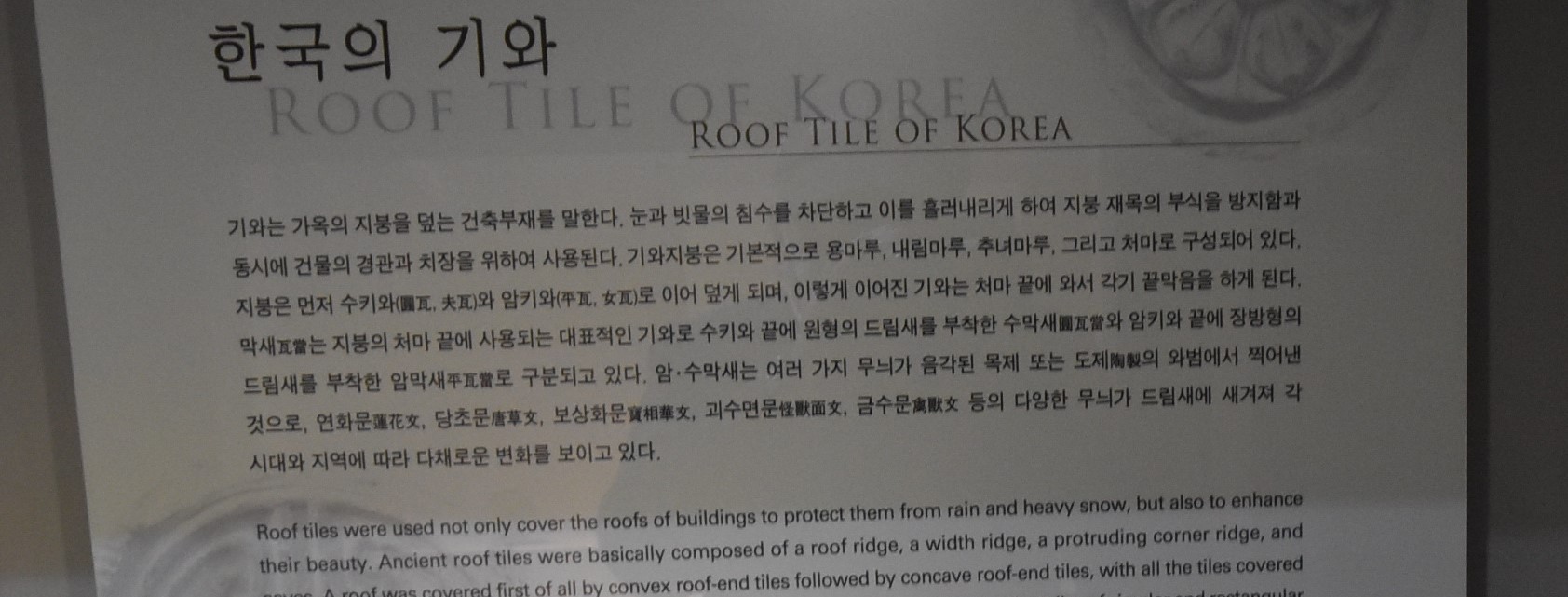


녹 유보상 화문 전. 괴 수면 와
녹 유보상 화문 전

연화문 수막새

다음은 민속관으로

수영야류 탈


화조도


장독대


화초 5층 탁자장


영여


떡살과 다식판


활과 부속품


각종장도







망건통

약관과 각대

적라의. 흑라의

자료가 방대하여 다음 페이지로 연결합니다